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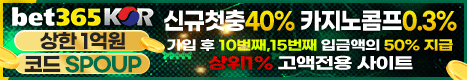 | |
[최용재의 까칠한 축구]FC서울 수뇌부는 '희생양' 황선홍 뒤에 숨었다
[일간스포츠 최용재]
FC서울이 '풍비박산'나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징조가 보였다. 2017시즌 리그 5위로 추락하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5년 연속 ACL에 출전한 K리그 대표 클럽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리고 맞이한 2018 K리그1(1부리그). 서울은 아직 승리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3경기를 치른 현재 1무2패로 10위로 밀려났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다.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반전을 기대하는 이는 드물다. 서울 내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꼬여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묵혀있던 문제점이 터진 것이다.
서울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을까.
많은 서울팬들은 부진의 '원흉'으로 황선홍 감독을 지목하고 있다. 황 감독은 지난 시즌 서울의 ACL 탈락을 막지 못했다. 올 시즌 '리빌딩'을 내세우면서 간판 선수들을 대거 내보냈다. 데얀, 오스마르, 윤일록 등이 서울을 떠났다. 특히 서울 공격의 '상징'이었던 데얀이 라이벌팀 수원 삼성으로 이적하자 데얀을 버린 황 감독을 향한 팬들의 거친 목소리가 터졌다.
맞다. 황 감독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선수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선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것도 감독의 책임이 일부 있다. 감독과 진정한 소통이 되는 선수라면 감독의 설득에 잔류할 수도 있는 일이다. 또 자신이 내보낸 선수들에 대한 정당성을 아직까지 경기력으로 증명하지도 못했다.
전술과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황 감독은 서울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지난 시즌부터 이렇다 할 색깔이 없는 경기력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다. 일부 서울팬들이 "황새 아웃"을 외치는 이유다.
그렇다면 황 감독만 책임을 지면 서울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아니다.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 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서울 수뇌부'다.
서울 수뇌부의 목표는 확실하다. 리그 우승? ACL 우승? 서울의 발전? 아니다. '현상 유지'와 '자리보전'이다.
수뇌부는 프로구단이라는 정체성을 버린 지 오래다. 프로구단이 흘러가는 흐름을 무시했다. 투자하지 않으면서 수도 구단이라는 혜택만 누리려 했다.
서울은 2010년과 2012년 우승을 차지한 K리그 '최강의 팀'이었다. 모든 이슈가 몰린 K리그 리딩 클럽이었다. 2013년에는 ACL 결승까지 올랐다. 언제나 리그가 개막하기 전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ACL에서도 아시아가 두려워하는 팀이었다. 많은 선수들이 서울을 '로망의 팀'으로 꼽았다. 대표팀에도 서울 선수가 발탁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팀으로 변했다. 그 누구도 서울의 우승을 점치지 않는다. ACL은 진출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은 정상급 선수들이 회피하는 구단이 됐다. 서울 스카우트 경쟁력이 한참 떨어졌다는 것은 업계에서 이미 유명한 얘기다. 그리고 현 대표팀에 1명도 발탁되지 못했다.
서울의 이런 '역변'은 구단 수뇌부가 주도한 일이다.
시작은 2014년이었다. 2013년이 서울 스쿼드에 어울리는 마지막 해였다. 데얀, 몰리나, 아디, 하대성 등 K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전 포지션에 포진했다. 2014년 서울은 급격하게 스쿼드의 질이 떨어졌다. 데얀, 하대성이 중국으로 떠났고, 아디는 은퇴했다.
핵심 선수가 떠나면 대체할 만한, '그에 준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프로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서울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핵심 선수가 떠나면 그걸로 끝이었다. 전력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는 없었다. 한참 떨어지는 선수 채우기로 급급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 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됐다. 당연히 성적과 경기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전임 최용수 감독은 악조건 속에서 꾸역꾸역 버텼다. 이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켰다. 서울 수뇌부는 투자에 더욱 소극적이 됐다. 투자하지 않아도, 우승은 아니더라도 리그 상위권, ACL 진출권 등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황 감독이 온 뒤에도 이런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 오랜기간 서울에 있었던 최 감독과 달리 짧은 기간의 황 감독 체제에서 추락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을 뿐이다.
5년을 이어온 서울의 흐름. 어떤 감독이 와도 이런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다. 투자하지 않는 서울에서 최강의 모습을 자랑하던 서울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2018시즌 서울의 스쿼드가 '서울에 어울리는' 스쿼드인가.
수뇌부를 제외한 모두가 아니라고 한다. 서울은 수도 구단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서울이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팀이 된 것 역시 수도 구단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답하려면 '서울다운' 팀을 만들어야 한다. K리그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지갑을 닫았다. 서울팬들의 마음도 닫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리빌딩에 실패'한 황 감독에게 돌리는 모양새다.
겉으로는 "황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를 만들어줬다"고 항변하고 있다. 진정 그럴까. 황 감독이 선수 영입과 스쿼드 구성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표현할 위치에 있지 않다. 구단의 소극적 투자 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감독의 신분이자 현실이다. 구단 수뇌부는 뒤에 숨어 전면에 있는 황 감독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축구인 A씨는 "사실상 황 감독도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승을 노리는 서울은 옛날이야기다. 수도 구단의 역할을 잊은지도 오래다. 지금 서울은 현상유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단 수뇌부의 생각은 한결같다. 돈을 많이 쓰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러니 돈을 조금 쓰고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 감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축구인 B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예산은 물론 제한적이다. 하지만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북이 그랬다. 수뇌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투자를 끌어냈고, 지금의 전북이 됐다. 전북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울 수뇌부가 자신의 자리를 걸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뇌부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럴 의지가 없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실패한다는 두려움이 커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현상유지가 목표다.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뇌부가 대한축구협회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또 다른 K리그 관계자가 내뱉은 충격적인 말이다. 그는 "서울 수뇌부는 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이 없다. 독재적인 모습이 강하다. 서울의 그 어떤 직원도 수뇌부에 'NO'라고 하지 못한다. 서울 내부에는 대한축구협회처럼 'YES맨'들만 넘친다. 팀이 잘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폭로했다.
황 감독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기 이전에 서울 수뇌부가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 수뇌부의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서울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최용재 기자
기사제공 일간스포츠
프로토, 해외배당, 스코어게임, 올스포츠, 먹튀검증, 네임드사다리, 네임드, 다음드, 알라딘사다리, 사다리분석, 네임드달팽이, 총판모집, 슈어맨, 로하이, 네임드, 가상축구, 먹튀레이더, 라이브맨, 토토, 먹튀폴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