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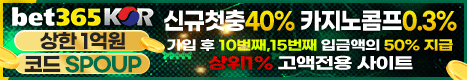 | |
골든글러브는 기자들 인기투표?
‘투승타타’란 말이 있다. ‘투수는 승리, 타자는 타점’의 줄임말로 기록 보는 시각이 점점 세분화되고 세이버메트릭스(Sabermetrics·야구를 통계·수학으로 분석하는 방법론)가 강조되는 요즘도 승리투수나 타점 같은 클래식 스탯(게임에서 사용자의 능력을 수치로 보여주는 체계)에 빠져 있는 이들을 비꼬려고 나온 말이다.
여전히 투승타타만을 아는 이들이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 OPS(출루율+장타율)를 모르는 현장 지도자도 있었다. 지금도 있을 것이다. 야구 기자의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꼭 투승타타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타율이나 도루 개수만으로 선수의 가치를 따지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한 해 최고의 선수를 뽑는 의미 있는 행사에서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한국시리즈가 끝나면 각 팀은 내년 준비에 들어간다. 야구가 없는 겨울, 흥미진진한 스토브리그와 함께 무료한 야구팬을 위한 이벤트 골든글러브 행사가 열린다. 수비력과 공격력을 나눠 골드글러브와 실버글러브를 주는 미국 메이저리그와 달리, 한국은 모두를 겸한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
하지만 기자단 투표로 이뤄지는 한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라는 말은 무색하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2004년 박경완은 홈런 34개를 치며 리그 홈런왕이 됐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1.035로 0.859를 기록한 홍성흔(사진)을 압도했다. 하지만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홍성흔이었다. 홍성흔이 박경완보다 앞선 건 ‘그놈의’ 타율과 타점이었고, 홍성흔이 포수로 뛴 경기는 고작 88경기였다(박경완은 포수로 132경기를 뛰었다).
이런 사례는 무척이나 많다. 홍성흔-박경완의 관계처럼 김동주와 김한수도 비슷한 경우다. 성적은 늘 김동주가 앞섰지만 골든글러브는 대부분 김한수의 몫이었다. 이러다보니 ‘카더라’까지 따라붙는다. 홍성흔은 특유의 쾌활한 성격으로 기자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반면, 김동주는 말수가 적고 기자에게 살갑지 않기 때문에 인기 없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골든글러브는 그저 기자들의 인기투표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이런 인식은 기자들이 자초했다. 논란의 골든글러브 행사가 끝나면 자신이 왜 그렇게 ‘어이없는’ 선택을 했는지 떳떳하게(!) 밝히는 기자들이 있다. <스포츠서울>의 한 기자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박병호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테임즈 대신 박병호에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역시 성적에서 더 뛰어난 나이트 대신 장원삼을 선택하며 “왼손 투수라는 점에서 인정받을 점이 있다”고 말한 기자도 있었다.
심각하게도 이들은 외국인을 차별하고 타고난 신체를 차별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해마다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두고 논란이 이는 건 이처럼 수준 낮은 기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기록도 볼 줄 모르는데다 외국인을 차별하고 친분에 따라 투표하는 이 한심한 기자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상의 결정권을 주는 게 과연 옳을까? 300명 넘는 투표인단 가운데 OPS와 WAR의 개념을 아는 이가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해졌다. ‘야구 기자’ 또는 ‘스포츠 기자’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
김학선 스포츠 덕후 겸 음악평론가
기사제공 한겨레21
올스포츠, 총판모집, 토토, 해외배당, 스코어게임, 네임드, 다음드, 먹튀검증, 로하이, 네임드, 사다리분석, 라이브맨, 네임드사다리, 슈어맨, 알라딘사다리, 네임드달팽이, 가상축구, 프로토, 먹튀레이더, 먹튀폴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