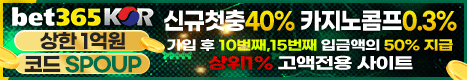 |  | |
뉴스/이슈
'최준용 연속퇴장 이슈'와 KCC의 연패 어찌 하오리까…"개성은 좋은데 과한 판정 불만? 경기까지 망쳐서야…"…
조아라유
0
12.31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흔히 스포츠의 세계에서 승부욕이나 투지는 선수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강력한 투지로 경기에 임하면 팀의 사기와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단결심을 드높인다. 하지만 적당할 때 '미덕'이고, 과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요즘 문득 떠오르는 이가 있다. 남자프로농구 부산 KCC의 간판 스타 최준용(30·2m)이다.
최준용은 리그 최상급 포워드다. 지난 시즌 자유계약선수(FA)로 KCC에 입단해 챔피언 등극을 도왔다. 올 시즌에도 발바닥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지만 '부상병동'인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게임체인저이자 해결사로서 역할을 잘 해왔다. 특히 지난 25일 정관장전에서는 서울에서 받기로 했던 주사치료를 미루고 부산으로 내려와 출전을 강행, 94대68 대승을 이끌며 4연패 탈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다. 이른바 몸값은 하는 선수다.
그런 그가 최근 2경기에서 불명예 기록을 떠안았다. 연속 '테크니컬파울+퇴장'이다. 개인기가 출중해 평소 파울 관리를 잘 하기로 소문난 그가 왜 이런 누를 범했을까. '최준용 퇴장 이슈'가 시작된 것은 지난 27일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 4쿼터 종료 7분20초 전, 골밑 돌파를 시도하던 중 현대모비스 장재석 김국찬에 둘러싸여 파울을 당한 뒤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코트 바닥을 내리치며 과하게 어필했다. 플레이 도중 비신사적 행위에 테크니컬파울이 불렸고, 2개째 누적으로 퇴장했다.
최준용은 리그 최상급 포워드다. 지난 시즌 자유계약선수(FA)로 KCC에 입단해 챔피언 등극을 도왔다. 올 시즌에도 발바닥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지만 '부상병동'인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게임체인저이자 해결사로서 역할을 잘 해왔다. 특히 지난 25일 정관장전에서는 서울에서 받기로 했던 주사치료를 미루고 부산으로 내려와 출전을 강행, 94대68 대승을 이끌며 4연패 탈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다. 이른바 몸값은 하는 선수다.
그런 그가 최근 2경기에서 불명예 기록을 떠안았다. 연속 '테크니컬파울+퇴장'이다. 개인기가 출중해 평소 파울 관리를 잘 하기로 소문난 그가 왜 이런 누를 범했을까. '최준용 퇴장 이슈'가 시작된 것은 지난 27일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 4쿼터 종료 7분20초 전, 골밑 돌파를 시도하던 중 현대모비스 장재석 김국찬에 둘러싸여 파울을 당한 뒤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코트 바닥을 내리치며 과하게 어필했다. 플레이 도중 비신사적 행위에 테크니컬파울이 불렸고, 2개째 누적으로 퇴장했다.
이전부터 최준용은 심판에게 레이업 과정에서 장재석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호소하는 등 판정 불만을 표시했다. 판정 불만은 모든 선수, 감독이 경기 중에 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거나 민감하게 자꾸 대응하면 '손해'만 남을 뿐이다.
최준용의 퇴장 당시 70-83으로 뒤져있던 KCC는 이후 9점차까지 추격했지만 더이상 탄력을 살리지 못한 채 79대95 패배를 받아들었다. 1쿼터 16-29로 크게 밀렸다가 2쿼터에 48-46으로 대역전을 했던 KCC로서는 최준용의 이른 퇴장이 못내 아쉬웠다.
아쉬움은 이틀 뒤, 서울 SK와의 결전에서도 재현됐다. 현대모비스전과 거의 같은 시간대인 4쿼터 종료 7분23초 전부터 '사고'가 터졌다. 당시 개인파울 2개였던 최준용은 최부경과의 매치업에서 과도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오펜스파울과 디펜스파울을 연달아 받았다. 2개의 파울을 추가하기까지 불과 16초. 앞서 오펜스파울을 받을 때 심판에게 항의했던 최준용은 디펜스파울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듯, 결국 폭발했고 테크니컬파울까지 추가했다. 16초 사이에 파울 3개를 쓸어담아 퇴장당하는 경우는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로 희귀한 장면이다.
최준용의 퇴장 당시 70-83으로 뒤져있던 KCC는 이후 9점차까지 추격했지만 더이상 탄력을 살리지 못한 채 79대95 패배를 받아들었다. 1쿼터 16-29로 크게 밀렸다가 2쿼터에 48-46으로 대역전을 했던 KCC로서는 최준용의 이른 퇴장이 못내 아쉬웠다.
아쉬움은 이틀 뒤, 서울 SK와의 결전에서도 재현됐다. 현대모비스전과 거의 같은 시간대인 4쿼터 종료 7분23초 전부터 '사고'가 터졌다. 당시 개인파울 2개였던 최준용은 최부경과의 매치업에서 과도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오펜스파울과 디펜스파울을 연달아 받았다. 2개의 파울을 추가하기까지 불과 16초. 앞서 오펜스파울을 받을 때 심판에게 항의했던 최준용은 디펜스파울도 억울하다고 생각한 듯, 결국 폭발했고 테크니컬파울까지 추가했다. 16초 사이에 파울 3개를 쓸어담아 퇴장당하는 경우는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로 희귀한 장면이다.
최준용의 퇴장은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 KCC는 불같은 추격전으로 4쿼터 종료 1분34초 전까지 81-74로 역전하며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내리 7실점,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전 분패(86대96)를 했다. KCC 구단 관계자들은 "최준용이 있었더라면 막판에 7점이나 주는 일은 없었을텐데…"라고 쓴 입맛을 다셨다.
최준용의 톡톡 튀는 개성이 '양날의 칼'이 된 셈이다. 강한 의지 표현이 '과한' 의지 표현으로 변질되다 보니 상대를 베어야 할 칼이 내몸을 벤 셈이 됐다. 프로 데뷔 9시즌째, '큰 선배'의 연차로 접어드는 최준용이라면 감정 컨트롤 하는 성숙함도 보여야 할 때다. 판정에 아무리 항의한들, 파울챌린지를 하지 않는 한 번복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초등학생 농구팬도 아는 사실이다.
최준용과 한솥밥을 먹었던 SK 안영준은 "최준용(형)이 뭘 싫어하는지 잘 안다. 우리 팀원들이 그걸 공략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결국 최준용은 상대의 '수'에 말린 '하수'가 되었고, 팀은 2연패를 안았다. "경기 임하는 파이팅, 개인기 다 좋은데, 판정에 집착하는 것만 고치면 좋을텐데…"라는 주변의 우려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최준용의 톡톡 튀는 개성이 '양날의 칼'이 된 셈이다. 강한 의지 표현이 '과한' 의지 표현으로 변질되다 보니 상대를 베어야 할 칼이 내몸을 벤 셈이 됐다. 프로 데뷔 9시즌째, '큰 선배'의 연차로 접어드는 최준용이라면 감정 컨트롤 하는 성숙함도 보여야 할 때다. 판정에 아무리 항의한들, 파울챌린지를 하지 않는 한 번복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초등학생 농구팬도 아는 사실이다.
최준용과 한솥밥을 먹었던 SK 안영준은 "최준용(형)이 뭘 싫어하는지 잘 안다. 우리 팀원들이 그걸 공략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결국 최준용은 상대의 '수'에 말린 '하수'가 되었고, 팀은 2연패를 안았다. "경기 임하는 파이팅, 개인기 다 좋은데, 판정에 집착하는 것만 고치면 좋을텐데…"라는 주변의 우려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최만식
먹튀검증, 라이브맨, 네임드달팽이, 먹튀레이더, 네임드, 올스포츠, 프로토, 네임드사다리, 로하이, 사다리분석, 스코어게임, 해외배당, 토토, 다음드, 먹튀폴리스, 가상축구, 슈어맨, 총판모집, 네임드, 알라딘사다리,
0 Comments












